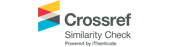서 론
토종닭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금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소규모 농가에서 주로 사육되어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전통 문화 유지에 기여해왔다. 또한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높은 적응력과 우수한 질병 저항성을 바탕으로 고유 가금 유전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 역시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현대 축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종닭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Xin et al., 2011; Cho et al., 2020; Jeong et al., 2020). 특히, 산란능력의 향상은 단순한 생산량 증가를 넘어 우리나라 고유 가축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산란능력은 유전적 요인 외에도 온도, 습도, 계절, 일조량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고온 또는 저온 환경에서는 체온 유지를 위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여 산란에 필요한 대사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Wipas et al., 2023; Li et al., 2024). 또한, 온도와 습도는 산란율, 난질, 혈청 생화학적 지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습 조건은 산란계의 호흡을 방해하여 생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산란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Tao and Xin, 2003; Kim et al., 2020). 더불어,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다습한 환경은 가금류의 체온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생산성과 생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22, 2024). 이러한 환경 스트레스는 닭의 열 스트레스 반응 및 생리적 기능 저하를 유발하므로 체온 조절과 면역 기능의 향상은 사양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Oke et al., 2024).
온·습도 지수(Temperature-Humidity Index, THI)는 온도와 습도의 복합적인 영향을 수치화한 지표로, 가금류의 생리적 반응 및 생산성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 et al., 2014). 특히, 고온다습한 조건은 닭의 대사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산란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THI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닭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를 위한 핵심 사양관리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Xin et al., 2011; Goel, 2021).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토종닭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과 더불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및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산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Cho et al., 2020). 이를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종합농장에서 사육·보존 중인 토종닭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집된 토종닭의 산란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환경 요인이 산란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온도 및 습도의 변화가 품종별 산란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각 품종에 적합한 최적의 사육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공시계는 경상국립대학교 종합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토종닭으로 토착로드종(KoreaN Rhode Island Red), 토착레그혼종(Korean White Leghorn), 토착코니시 갈색종(Korean Brown Cornish), 한국재래닭(Korean Native Chicken) 4품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2022년 1,261수, 2023년 1,276수, 2024년 1,201수의 산란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산란율은 18주령부터 65주령까지 주령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진주 지역의 기상 데이터와 닭의 산란율 데이터를 결합하여 외부 환경 요인이 산란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기간은 3년으로 설정되었으며, 주간별 기상 데이터와 산란율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경상국립대학교 종합농장 내의 육추사 및 종계사에서 종계의 사양 관리를 50주 동안 사육하였다. 초반 12주령까지는 3단 3열 배터리형 케이지(660 cm2/수)가 설치된 육추사에서 사육되었다. 이후 50주령까지는 자동 급이 및 자동 집란 시스템이 완비된 평사식 종계사(23.7 cm2/수)에서 관리되었다. 사료 급여는 사육 단계에 따라 어린 병아리, 중 병아리, 산란 전기, 산란 초기 및 산란 중기로 구분하여 상업용 시판 종계사료를 전 사육 기간 동안 자유롭게 제공하였다. 점등 관리는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준을 따랐으며, 4주령에 입식 후 처음 14시간 45분의 점등을 시작하여 16주까지 9시간 30분으로 줄였고, 17주령에는 11시간으로 증가시켜 27주령까지 점등 시간을 17시간으로 고정하였다. 백신 접종은 뉴캐슬병 및 전염성 기관지염 등의 백신을 국립축산과학원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 그 외의 일반적인 닭 사양 관리는 경상국립대학교의 닭 사육 관리 기준을 따랐으며, 관련 시험에 참여한 닭의 관리 및 취급은 본 대학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데이터를 기상청 홈페이지로부터 확보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는 진주 지역의 최근 3년간 주간 단위의 기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수집된 기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최고 온도(high temperature, High T): 각 주간의 최고 기온
최저 온도(low temperature, Low T): 각 주간의 최저 기온
평균 온도(average temperature, Avg T): 각 주간의 평균 기온
최고 상대습도(high relative humidity, High RH): 각 주간의 최고 습도
최저 상대습도(low relative humidity Low RH): 각 주간의 최저 습도
평균 상대습도(average relative humidity, Avg RH): 각 주간의 평균 습도
일교차(daily temperature range, DTR): 하루 동안 기록된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간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계사 내부의 고온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THI를 산정하였다. THI는 다양한 축종, 특히 육계에서 고온 스트레스 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온도와 상대습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THI 지수는 NRC(1971) 및 Dikmen and Hansen(2009)의 연구를 기반으로 산정하였으며(Ha et al., 2018),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T는 평균 온도를, RH는 평균 상대습도를 나타낸다. 산출된 THI 지수를 활용하여 닭의 고온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 과
토종닭의 품종과 주령에 따른 산란율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토착로드종(Korean Rhode Island Red), 난용계인 토착레그혼종(Korean White Leghorn), 토착코니시 갈색종(Korean Brown Cornish), 한국재래닭(Korean Native Chicken)을 대상으로 18주령부터 65주령까지 산란율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품종별 산란율을 비교한 결과, 토착레그혼종이 51.54%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산란율을 보였고 토착코니시종이 11.04%로 가장 낮은 산란율을 나타냈다. 또한 토종닭의 주령에 따른 산란율을 분석한 결과, 산란이 시작된 18주령부터 29주령 구간은 28.29%, 30~39주령 구간은 37.07%, 40주령 이후는 37.86%로 18~29주령 구간의 산란율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The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토종닭의 산란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온도, 상대습도, THI에 따른 산란율을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온도는 FAO에서 제시한 산란계 최적 온도 범위인 11~26°C를 기준으로 하여, 11°C 미만은 저온 구간, 26°C 초과는 고온 구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상대습도는 40~60%, 60~80%, 80~100% 세 구간으로 나누었으며, THI는 30~89 범위 내에서 6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The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온도에 따른 산란율 분석 결과, 26°C를 초과하는 고온 구간에서 산란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상대습도 또한 80~100%의 높은 습도 구간에서 유의하게 낮은 산란율이 나타났다. THI 분석 결과, 80~89 구간에서 다른 구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산란율이 관찰되었고, 산란율이 가장 높은 40~49 구간에 비하여 약 10% 정도 낮은 산란율을 보였다. 이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토종닭의 산란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품종 특성과 함께 THI 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안정적인 산란 성적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토종닭의 산란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온도 및 습도와 관련된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통해 산란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요인을 탐색한 결과, 일교차(DTR), 최저 상대습도, 최고 상대습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요인들 간의 세부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상대습도(Avg RH), 최고 상대습도(High RH), 최저 상대습도(Low RH), 일교차(DTR), 최고 온도(High T), 최저 온도(Low T)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토종닭 산란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교차 및 최저 상대습도는 산란율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최고 상대습도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일교차가 크거나 습도가 낮을수록 산란율은 감소하고 습도가 높을수록 산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일교차는 산란율과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변수로 기온 변화 폭이 클수록 닭의 생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산란 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c The different letters of superscript within the column significantly differ (P<0.01). An asterisk (*) is used to indicate when the P-value is not significant
In the table, relative humidity is denoted as RH, temperature as T, Laying Rate as LR, and daily temperature range as DTR.
또한, 높은 습도 조건에서 산란율이 증가하는 양상은 외부 기후 요인 뿐만 아니라 습도가 상승 시 실시되는 환기 및 온도 조절과 같은 사양 관리의 효과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는 산란율 향상을 위해 습도, 일교차 등 복합적인 환경 요인을 고려한 사육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는 토종닭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 설정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종닭의 산란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요인인 온도와 습도가 산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앞서 확인하였다. 특히, 이 두 요소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THI는 산란율과의 상관성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지표로 나타났다. THI 값이 높을수록 닭이 경험하는 열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THI, 주령, 품종 간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이들 간의 복합적인 작용이 산란율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HI, 주령, 품종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산란율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계산된 THI 지수는 30에서 80의 범위로 10단위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s. 1~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THI 지수와 주령은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고, 품종에 따라 THI 변화에 대한 산란율 반응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THI 수준별로 포함된 주령 범위는 다음과 같다. THI 30~39 18~30주령, THI 40~49 19~35주령, THI 50~59 18~43주령, THI 60~69 19~43주령, THI 70~79 26~43주령, THI 80이상은 32~38주령이다. 이러한 결과는 THI 값에 따라 산란율 분석에 포함된 주령 범위가 상이함을 시사하며 각 THI 수준에 대응하는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 산란율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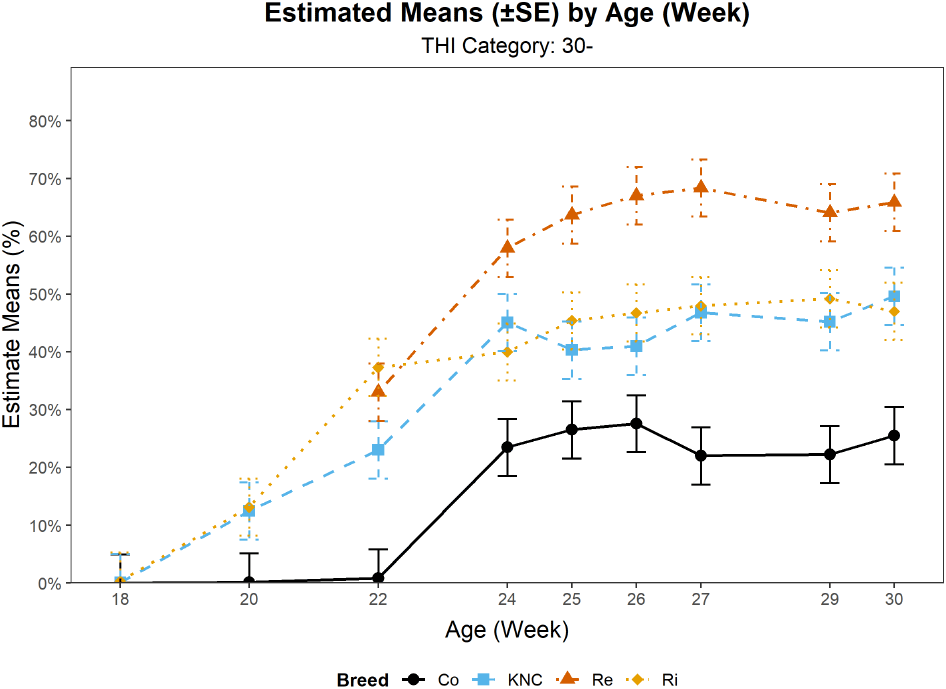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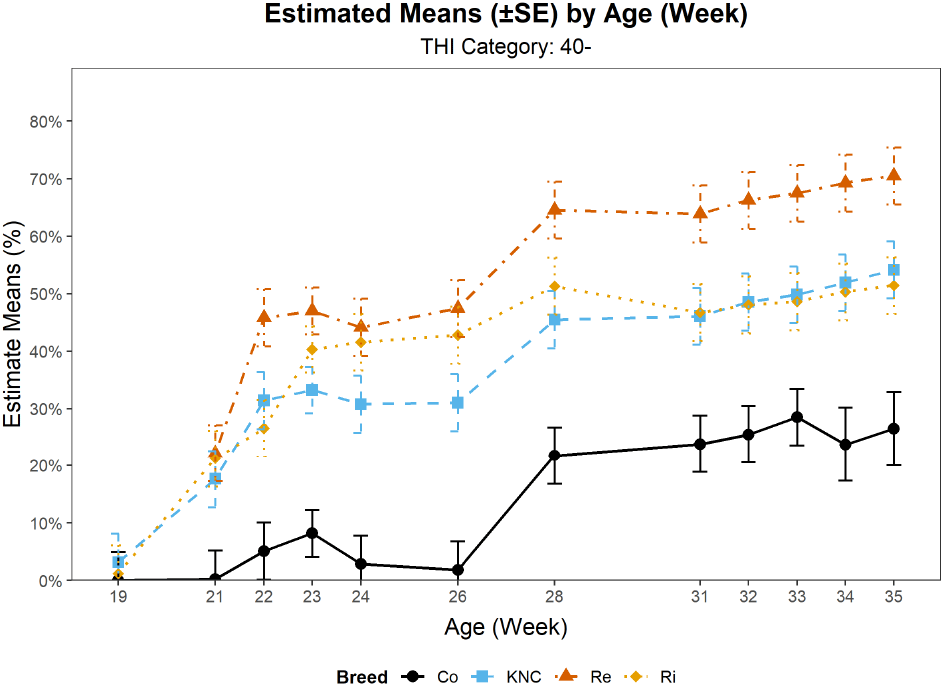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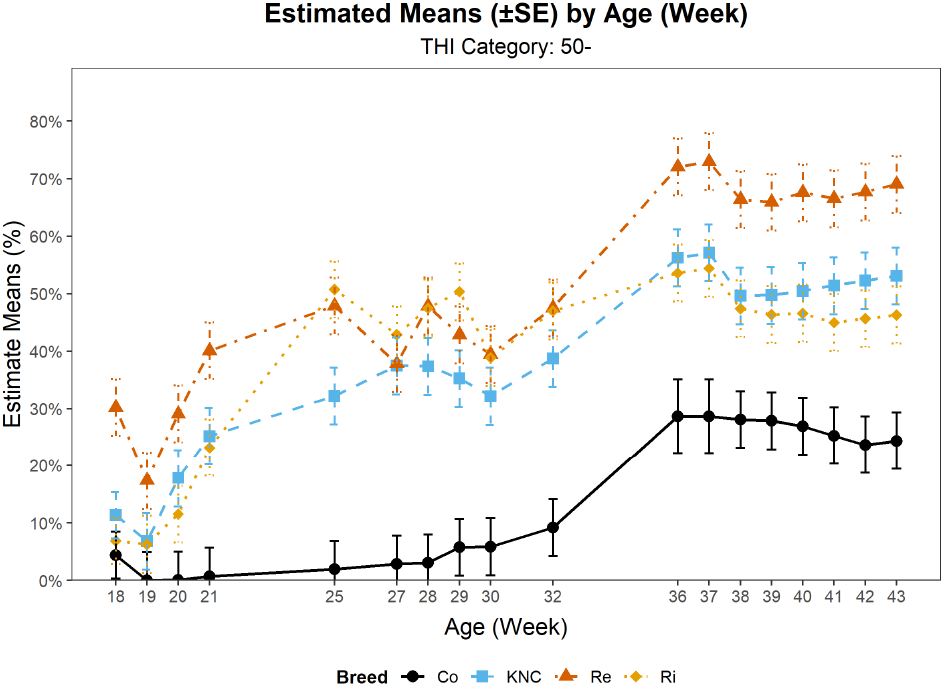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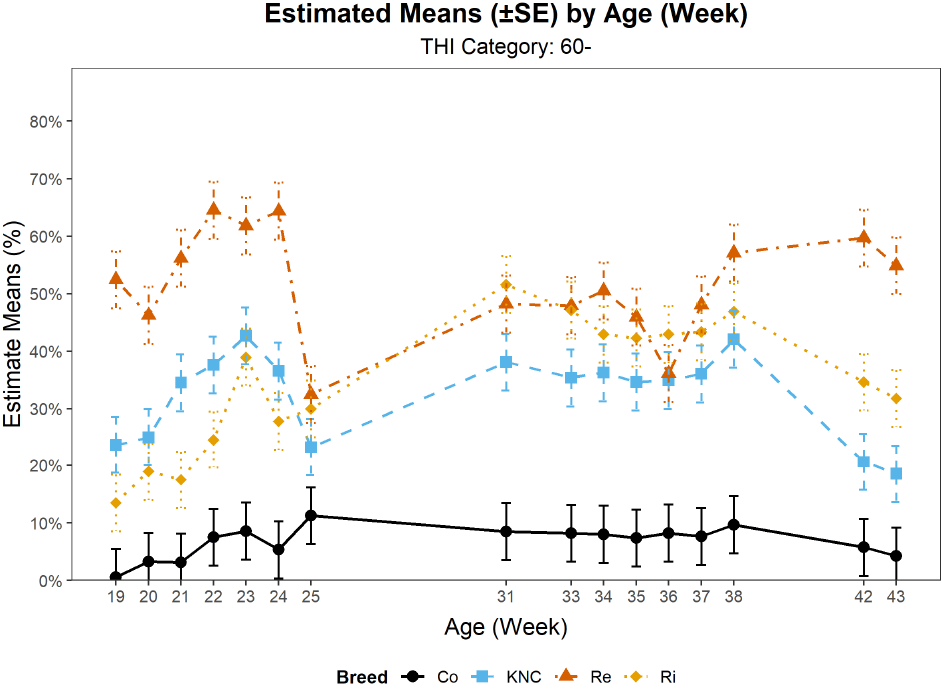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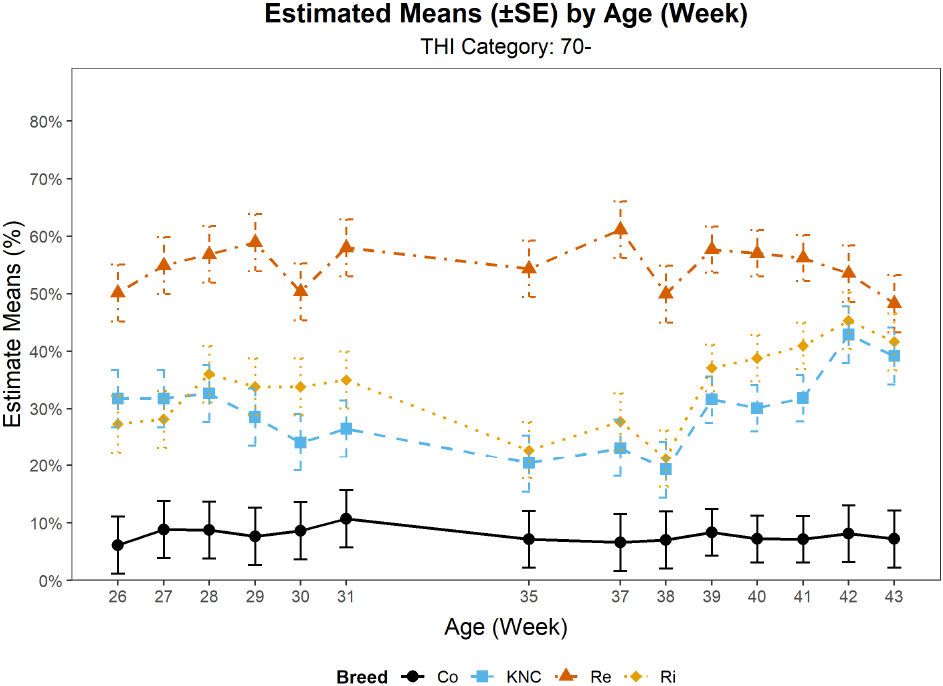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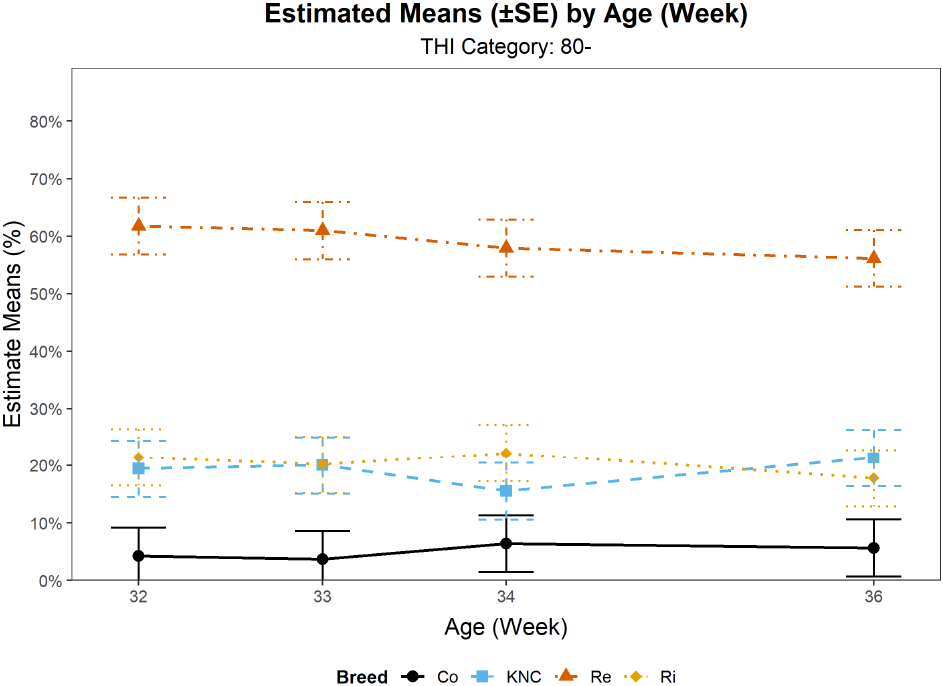
Fig. 1의 THI 30~39 범주에서는 대부분의 품종에서 높은 산란율을 보였으며, 평균 산란율은 35.26%로 나타났다. 또한, Fig. 2의 THI 40~49 범주는 전체 구간 중 가장 높은 산란율인 35.84%를 기록하였다. 반면, Fig. 3의 THI 50~59 범주에서는 산란율이 다소 감소하여 평균 34.77%를 나타냈다. THI 60~69(Fig. 4) 범주에서는 평균 산란율이 31.39%로 감소하였고, THI 70~79(Fig. 5) 범주에서는 소폭 증가하여 평균 산란율은 31.83%였으나, THI 30~59 구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Fig. 6의 THI 80~89 범주에서는 평균 25.93%로 전체 THI 구간 중 가장 낮은 산란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THI가 증가함에 따라 산란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토착레그혼종은 전 구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산란율을 유지하며 높은 산란율을 나타낸 반면, 토착코니시종은 THI 상승에 따라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THI 70 이상에서는 분석에 적용된 모든 토종닭 품종에서 산란율 곡선이 완만한 형태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낮은 산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찰
닭의 최적 산란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환경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FAO에 제시된 산란계 최적 온도 범위(11~26°C)는 닭이 스트레스 없이 산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FAO, 2003). 열 스트레스는 사료 섭취량 감소, 체중 감소, 그리고 계란 생산의 저하를 유발한다(Kim et al., 2020, 2024). 높은 온도는 닭의 신진대사와 체온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체온 상승, 호흡 변화, 그리고 생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한다(Radwan, 2020; Wipas et al., 2023). 이러한 스트레스는 닭의 면역력을 억제하고, 여러 질병의 발생을 증가시킨다(Mashaly et al., 2004). 또한, 상대 습도가 50%~70%일 때, 닭의 체온 조절과 호흡이 최적화되어 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Tilbrook and Fisher, 2020). 상대 습도는 계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료 섭취량과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산란능력에 영향을 미친다(Oke et al., 2024; Chris et al., 2025).
일교차가 적을수록, 닭의 산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큰 일교차는 닭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해 산란 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육 환경에서 온도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Muiruri and Harrison, 1991; Alves et al., 2012). 이러한 환경 조건을 유지하면 닭은 스트레스 없이 최적의 산란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과 계란 품질을 향상에 기여한다(Li et al., 2020; Kim et al., 2023). 열 스트레스는 닭의 생리적 반응을 변화시켜, 산란 능력과 계란 품질을 저하시킨다(Kim et al., 2020; Wasti et al., 2020; Kim et al., 2024). 이러한 반응은 체온 조절 메커니즘의 변화, 호흡기 알칼리증, 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나타나 닭의 건강과 생산성을 저해한다. 특히, 열 스트레스는 혈액 내 전해질 균형을 방해하여, 생산 잠재력을 감소시키고, 난각 품질을 저하시킨다. 기후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닭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관리 전략이 필수적이다(Ribeiro et al., 2020; Hu et al., 2021; Ncho et al., 2025).
본 연구에서는 Generalized Linear Model(GLM)을 활용하여 온도, 습도, THI, 일교차가 닭의 산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한국 토종닭 4품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토착레그혼종이 51.54%로 가장 높은 산란율을 기록하였고, 토착코니시종이 11.04%로 가장 낮은 산란율을 나타냈다. 또한 18주령부터 29주령까지 구간의 산란율이 가장 낮았으며, 30주령 이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온 구간(26°C)과 상대습도 80~100%의 산란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 토종닭 4품종의 산란율을 분석한 이전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Cho et al., 2020).
외부 환경 요인 중 특히 온도 범위는 산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THI가 산란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THI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산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Ha et al., 2018; Kang et al., 2020; Satoh et al., 2023). THI 수준이 낮을수록 산란율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특히 THI 80 이상일 경우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며, 고온다습한 환경이 닭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산란능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He et al., 2019; Vandana et al., 2021).
THI, 주령, 품종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 결과, 토착레그혼종은 높은 THI 조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산란율을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산란율이 나타났다. 반면, 토착코니시종은 고온 환경에서 산란율이 크게 감소하여 품종별 특성에 따라 사육 조건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Mack et al., 2013). 또한, 주령이 증가함에 따라 산란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30주 이후부터 뚜렷한 증가가 나타나 사육 전략 수립 시 주령을 고려한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품종별 산란율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유전적 특성과 환경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생산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ozenboim et al., 2007; Mack et al., 2013).
본 연구는 THI, 주령, 품종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산란율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환경 조건에서 최적의 산란율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여름철과 같은 고온 환경에서는 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품종 선발 및 사육 조건의 조절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Nascimento et al., 2014; Ribeiro et al., 2020; Peng et al., 2024). 이러한 분석 결과는 토종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품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활용될 수 있다(Xin et al., 2011).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환경 요인과 사육 전략 간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토종닭 사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닭의 산란율 최적화를 위한 외부 환경 조절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양 관리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Kang et al., 2020; Satoh et al., 2023). 특히, 습도 관리와 온도 조절은 사육 환경을 최적화하고 산란율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농가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변수를 조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Cho et al., 2020; Satoh et al., 2023), 이는 지속 가능한 양계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추가 연구에서는 조명, 사료의 질, 스트레스 요인 등 다른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정밀한 최적 사육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Ncho et al., 2025). 이러한 분석은 닭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계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현장 적용과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본 연구는 온도, 습도, THI, 주령 및 품종이 한국 토종닭의 산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데이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국립대학교 종합농장에서 사육된 3,738마리의 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된 품종은 토착로드종(Korean Rhode Island Red), 토착레그혼종(Korean White Leghorn), 토착코니시 갈색종(Korean Brown Cornish), 한국재래닭(Korean Native Chicken)이다. 산란율은 18주부터 65주까지 측정하였고, 진주 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부 환경조건을 평가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9.4를 사용하여 회귀분석과 혼합 모델 분석을 수행하였다. THI는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되었다:
여기서 RH는 평균 상대습도(%)이며, T는 평균 기온(°C)이다. THI 분석 결과, 40~49 범위에서 가장 높은 산란율(35.84±20.57%)이 나타난 반면, 80~89 범위에서 가장 낮은 산란율(25.93±20.61%)을 보였다. 주령 분석 결과에서는 18~29주령에 비하여 30~39주와 40주 이상에서 높은 산란율이 확인되었다. 품종별로는 토착레그혼종이 가장 높은 산란율(54.13±12.23%)을 보였으며, 토착코니시의 산란율(10.24±9.58%)이 가장 낮았다. GLM 분석 결과, 높은 습도(P<0.01)와 일교차(P<0.01), 최고 기온(P<0.01)과 최저 기온(P<0.01)이 산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THI, 주령, 품종 간의 상호작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P<0.01). 본 연구는 THI를 40~49 범위에서 산란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품종별 환경에 맞춘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토종닭의 생산능력 향상과 사육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